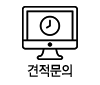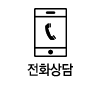밍키넷 74.kissjav.click ホ 밍키넷 링크ブ 밍키넷 검증イ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밍키넷 74.kissjav.click ホ 밍키넷 링크ブ 밍키넷 검증イ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관련링크
-
 http://74.kissjav.help
0회 연결
http://74.kissjav.help
0회 연결
-
 http://68.588bam2.top
0회 연결
http://68.588bam2.top
0회 연결
본문
밍키넷 61.kissjav.help パ 밍키넷ド 밍키넷 링크タ 무료야동ゼ 무료야동사이트ヂ 밍키넷 링크ネ 밍키넷 새주소ケ 밍키넷 접속ョ 밍키넷 접속ホ 밍키넷 우회ゼ 무료야동ポ 밍키넷 검증パ 밍키넷 트위터ワ 밍키넷 우회ド 밍키넷 우회テ 밍키넷 링크ウ 밍키넷 주소찾기ヮ 밍키넷ヤ 밍키넷 우회ギ 밍키넷ブ 밍키넷 트위터ゥ 야동사이트マ
2021년 10월7일 새만금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에서 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찍은 항공기 조류충돌 위기 사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
Q.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판결, 국토부는 왜 그랬을까?
A.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선 그야말로 역사적 판결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에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단 이유로 국책사업을 아예 취소시킨 판결은 처음이거든요.
판결의 핵심은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대학생 국가장학금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인천이나 군산, 무안공항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높은데도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의 충격이 아직 생생한데, 국토부는 대체 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룬 걸까요?
그 배경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어요. 조류 충돌 위험을 살피는 건 환경영향평가 때 하는 일이에요. 환경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영향평가는 공항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제도예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어간다는, 시대적 공감이 바탕이 됐어요.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사회·경제, 생활환경의 6대 분야를 평가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요. 사계절 영향을 다 봐야 해 통상 1년 이상 기간을 두죠.
학자금대출문의 한데 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통과 의례’나 ‘면죄부’처럼 다뤄져 왔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부가 의견을 내는데, ‘동의’ 비율은 90% 이상, ‘부동의’ 비율은 1%대에 불과해요. 통상 환경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식의 ‘조건부 동의’가 이뤄지는데, 이행을 감시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해요.
가장 은행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 주체의 의뢰를 받은 대행업체가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발주처 입맛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죠. 실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는 ‘거짓·부실 평가’가 만연해 있어요.
9월 자동차 판매조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문정현 신부(오른쪽)와 문규현 신부가 인용 판결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번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을 따지면서 운영 중인 공항에 적용하는 ‘반경 5㎞’ 기준을 적용했어요. 운영 중인 공항은 실제 충돌 기록이나 계절별 조류 이동 자료, 서식지 분포 같은 기록이 있지만, 신규 공항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파악해야 하므로 주변 생태계를 충분히 포괄하는 ‘반경 13㎞’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국토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무시한 거예요. ‘반경 13㎞’ 기준으로 재판부가 밝힌 새만금신공항의 예상 연간 조류 충돌 횟수는 무려 45.92930회였어요. 지난해 조류 충돌로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이 0.07225회였던 것과 견주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이 문제를 지적한 최재홍 변호사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모델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짚었어요.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큰 곳은 조류 서식지로서 가치를 봐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신공항 부지는 많은 새가 살고 머무는 곳이니, 공항을 짓기보단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새들은 계절을 따라 지구를 이동하며 살아가요. 지구 상엔 크게 4개의 주요 경로가 있는데 한국은 ‘동아시아-대양주 경로’(EAAF)에서 중요한 기착지예요. 새들은 호주·뉴질랜드의 연안 습지나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여름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알래스카에서 번식해요. 봄·가을엔 한국의 서해안 갯벌과 중국, 북한의 서해 연안 지역에 머물러요. 한국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북극으로 이동하는 도요새와 물떼새가 크게 줄었다며 금강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달라고 수년 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새만금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어요. 여러 개발 사업에서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수사나 재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고요. 부실 평가가 밝혀져 대행업체가 처벌받았는데,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해줘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사례도 있어요. 경남 거제 남부관광단지나 부산의 대저대교가 그런 경우예요. 국토부가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소홀히 다룬 데에도 이런 현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는 명분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봤겠죠. 이번 판결은 이런 오랜 관행을 깬,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평가 주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해왔어요. 이른바 ‘공탁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어요.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Q.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판결, 국토부는 왜 그랬을까?
A.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선 그야말로 역사적 판결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에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단 이유로 국책사업을 아예 취소시킨 판결은 처음이거든요.
판결의 핵심은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대학생 국가장학금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인천이나 군산, 무안공항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높은데도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의 충격이 아직 생생한데, 국토부는 대체 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룬 걸까요?
그 배경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어요. 조류 충돌 위험을 살피는 건 환경영향평가 때 하는 일이에요. 환경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영향평가는 공항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제도예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어간다는, 시대적 공감이 바탕이 됐어요.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사회·경제, 생활환경의 6대 분야를 평가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요. 사계절 영향을 다 봐야 해 통상 1년 이상 기간을 두죠.
학자금대출문의 한데 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통과 의례’나 ‘면죄부’처럼 다뤄져 왔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부가 의견을 내는데, ‘동의’ 비율은 90% 이상, ‘부동의’ 비율은 1%대에 불과해요. 통상 환경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식의 ‘조건부 동의’가 이뤄지는데, 이행을 감시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해요.
가장 은행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 주체의 의뢰를 받은 대행업체가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발주처 입맛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죠. 실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는 ‘거짓·부실 평가’가 만연해 있어요.
9월 자동차 판매조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문정현 신부(오른쪽)와 문규현 신부가 인용 판결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번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을 따지면서 운영 중인 공항에 적용하는 ‘반경 5㎞’ 기준을 적용했어요. 운영 중인 공항은 실제 충돌 기록이나 계절별 조류 이동 자료, 서식지 분포 같은 기록이 있지만, 신규 공항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파악해야 하므로 주변 생태계를 충분히 포괄하는 ‘반경 13㎞’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국토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무시한 거예요. ‘반경 13㎞’ 기준으로 재판부가 밝힌 새만금신공항의 예상 연간 조류 충돌 횟수는 무려 45.92930회였어요. 지난해 조류 충돌로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이 0.07225회였던 것과 견주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이 문제를 지적한 최재홍 변호사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모델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짚었어요.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큰 곳은 조류 서식지로서 가치를 봐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신공항 부지는 많은 새가 살고 머무는 곳이니, 공항을 짓기보단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새들은 계절을 따라 지구를 이동하며 살아가요. 지구 상엔 크게 4개의 주요 경로가 있는데 한국은 ‘동아시아-대양주 경로’(EAAF)에서 중요한 기착지예요. 새들은 호주·뉴질랜드의 연안 습지나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여름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알래스카에서 번식해요. 봄·가을엔 한국의 서해안 갯벌과 중국, 북한의 서해 연안 지역에 머물러요. 한국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북극으로 이동하는 도요새와 물떼새가 크게 줄었다며 금강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달라고 수년 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새만금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어요. 여러 개발 사업에서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수사나 재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고요. 부실 평가가 밝혀져 대행업체가 처벌받았는데,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해줘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사례도 있어요. 경남 거제 남부관광단지나 부산의 대저대교가 그런 경우예요. 국토부가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소홀히 다룬 데에도 이런 현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는 명분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봤겠죠. 이번 판결은 이런 오랜 관행을 깬,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평가 주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해왔어요. 이른바 ‘공탁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어요.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