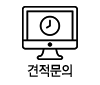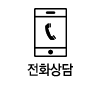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
>- 포트폴리오 >
- [복사본] 인테리어뉴스
관련링크
-
 http://79.588bam3.top
0회 연결
http://79.588bam3.top
0회 연결
-
 http://49.kissjav.life
0회 연결
http://49.kissjav.life
0회 연결
본문
황주리 화가·동국대 석좌교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며칠 사이 가을이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때리고 있으라 한다.
문득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처럼 좋은 게 있으랴. 하지만 밝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친구가 내가 좋아할 거라며 알려준 영화를 보던 중 그 내용이 며칠 전 친한 후배가 들려준 사연과 겹쳤다. 후배는 악성 암에 걸린 지인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가는 길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영화 같은 내용들이 현실에 널려있는 이 꿈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금세 밝음이 도망간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살 만큼 살았다 싶을 디딤돌 보금자리론 때, 게다가 기운이 좀 남아있을 때 편안한 사람과 동행하는 마지막 여행, 너무 바라는 게 많은지도 모른다.
■
「 평생 두 차례 스쳤던 이의 죽음 내 삶이 지난 듯 덧없음 증폭돼 노란색의 밝음이 날 위로하니 」
그림=황주리
저축은행대출금리비교
살 만큼 살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오거나 영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도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온다. 여기서 동행인의 편안함은 애정인지 우정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는, 신뢰를 동반한 느낌이다. 그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어쩌면 새봄적금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아주 가까운 존재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본 어느 영화에서 돈 많은 노부인이 매일 유언장을 고치는 장면이 생각난다. 그녀는 매일 고마운 사람들에게 줄 돈의 액수와 이름을 고쳐 쓴다. 마음은 늘 달라지고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마지막 여행에 누구와 같이 가고 싶은지도 그때 가봐야 알 것이다. 너무 늦게 찾아온 가을은 어두 대출 거치기간 운 생각은 그만하라고 내 어깨를 툭 친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는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얼떨결에 맞선을 보았다. 45년 전의 어느 가을날, 집 근처의 그 시절 꽤 분위기 있었던 대학로의 ‘오감도’에서였다. 누구나 알만한 집안의 장남인 상대는 왠지 마음이 놓이고 훈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약관대출 그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 그와 두어 번 만나고 부모님끼리 만나자는 이야기가 오갔을 때, 언제나 매사에 진보적인 우리 아버지는 “넌 거기 시집가면 그림 못 그린다” 하셨다. 결국 긴 가족회의 끝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 뒤 삼십 년 후 나는 어느 사업가들 모임에 특강하러 갔다가 그를 만났다. 그와 나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옛날을 흔쾌히 기억했다.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지 그 작은 명함 속에 부부의 사진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한 2년 뒤 우연히 길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어색한 기분으로 내가 그랬던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신문에서 그의 이른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평생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의 죽음이 이상하게도 덧없음을 증폭시켰다. 그 시절의 내 젊은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떠난 자의 옷깃을 잠시 스쳐 지났던 나의 삶 역시 확 지나간 기분 같은 거랄까? 어디선가 들은 외국 노랫말이 떠올랐다. “벗이 오면 좋은 술로 맞이하고 늑대가 오면 엽총으로 맞이하지.” 이 뜬금없는 노랫말은 걱정하지 말고 매 순간 용감하게 즐겁게 살라는 메시지다. 하긴 예정된 죽음을 빤히 알면서도 밝은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오랜 세월 전화 한 통 없던 혈육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할 때이다. 혈육에 대한 집착이 없는 편인 나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한 사르트르의 과장법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큰일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고 작은 일에는 연민을 갖고 대하라”는 알베르 카뮈 쪽을 좋아한다.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한 존재로 느껴진다. 독신으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세상, 조카를 견제하는 이모 고모 삼촌들의 모임이 다 있다고 한다. 가까운 혈육이 의미 있던 세상은 가고 촌수가 멀수록 아니 남일수록 편안한 세상이 오고 있는지 모른다. 거저 달라는 법 없는 타인이 거저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혈육보다 귀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요즘 나는 시내의 어느 커다란 병원에서 전시 중이다. 전시의 제목은 ‘밝음에 관하여’이다. 어린 환자와 휠체어를 미는 할머니가 열심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득 나도 그만할 때 환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어린이 우울증 환자, 그 병이 어떻게 저절로 나았는지 모르나 아직도 내게는 그 병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른다. 전시 안내장 안에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때로 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치유한다. 그중에서도 밝은 노란색, 그 밝음이 나를 위로한다. 나는 괜찮다. 당신도 그러하길.”
황주리 화가·동국대 석좌교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며칠 사이 가을이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때리고 있으라 한다.
문득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처럼 좋은 게 있으랴. 하지만 밝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친구가 내가 좋아할 거라며 알려준 영화를 보던 중 그 내용이 며칠 전 친한 후배가 들려준 사연과 겹쳤다. 후배는 악성 암에 걸린 지인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가는 길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영화 같은 내용들이 현실에 널려있는 이 꿈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금세 밝음이 도망간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살 만큼 살았다 싶을 디딤돌 보금자리론 때, 게다가 기운이 좀 남아있을 때 편안한 사람과 동행하는 마지막 여행, 너무 바라는 게 많은지도 모른다.
■
「 평생 두 차례 스쳤던 이의 죽음 내 삶이 지난 듯 덧없음 증폭돼 노란색의 밝음이 날 위로하니 」
그림=황주리
저축은행대출금리비교
살 만큼 살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오거나 영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도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온다. 여기서 동행인의 편안함은 애정인지 우정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는, 신뢰를 동반한 느낌이다. 그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어쩌면 새봄적금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아주 가까운 존재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본 어느 영화에서 돈 많은 노부인이 매일 유언장을 고치는 장면이 생각난다. 그녀는 매일 고마운 사람들에게 줄 돈의 액수와 이름을 고쳐 쓴다. 마음은 늘 달라지고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마지막 여행에 누구와 같이 가고 싶은지도 그때 가봐야 알 것이다. 너무 늦게 찾아온 가을은 어두 대출 거치기간 운 생각은 그만하라고 내 어깨를 툭 친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는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얼떨결에 맞선을 보았다. 45년 전의 어느 가을날, 집 근처의 그 시절 꽤 분위기 있었던 대학로의 ‘오감도’에서였다. 누구나 알만한 집안의 장남인 상대는 왠지 마음이 놓이고 훈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약관대출 그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 그와 두어 번 만나고 부모님끼리 만나자는 이야기가 오갔을 때, 언제나 매사에 진보적인 우리 아버지는 “넌 거기 시집가면 그림 못 그린다” 하셨다. 결국 긴 가족회의 끝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 뒤 삼십 년 후 나는 어느 사업가들 모임에 특강하러 갔다가 그를 만났다. 그와 나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옛날을 흔쾌히 기억했다.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지 그 작은 명함 속에 부부의 사진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한 2년 뒤 우연히 길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어색한 기분으로 내가 그랬던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신문에서 그의 이른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평생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의 죽음이 이상하게도 덧없음을 증폭시켰다. 그 시절의 내 젊은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떠난 자의 옷깃을 잠시 스쳐 지났던 나의 삶 역시 확 지나간 기분 같은 거랄까? 어디선가 들은 외국 노랫말이 떠올랐다. “벗이 오면 좋은 술로 맞이하고 늑대가 오면 엽총으로 맞이하지.” 이 뜬금없는 노랫말은 걱정하지 말고 매 순간 용감하게 즐겁게 살라는 메시지다. 하긴 예정된 죽음을 빤히 알면서도 밝은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오랜 세월 전화 한 통 없던 혈육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할 때이다. 혈육에 대한 집착이 없는 편인 나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한 사르트르의 과장법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큰일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고 작은 일에는 연민을 갖고 대하라”는 알베르 카뮈 쪽을 좋아한다.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한 존재로 느껴진다. 독신으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세상, 조카를 견제하는 이모 고모 삼촌들의 모임이 다 있다고 한다. 가까운 혈육이 의미 있던 세상은 가고 촌수가 멀수록 아니 남일수록 편안한 세상이 오고 있는지 모른다. 거저 달라는 법 없는 타인이 거저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혈육보다 귀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요즘 나는 시내의 어느 커다란 병원에서 전시 중이다. 전시의 제목은 ‘밝음에 관하여’이다. 어린 환자와 휠체어를 미는 할머니가 열심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득 나도 그만할 때 환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어린이 우울증 환자, 그 병이 어떻게 저절로 나았는지 모르나 아직도 내게는 그 병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른다. 전시 안내장 안에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때로 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치유한다. 그중에서도 밝은 노란색, 그 밝음이 나를 위로한다. 나는 괜찮다. 당신도 그러하길.”
황주리 화가·동국대 석좌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